사람이란 묘해서 첫인상은 믿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어떤 장면은 오래도록 마음에 박아 둔다. 내게 박찬대가 그랬다. 2019년 천주교 대전교구장이신 유흥식 주교님도 참석한 국회 포콜라레 행사장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 그는 의례와 형식의 갑옷을 입지 않은 정치인이었다. 말은 번드르르하지 않았고, 몸짓은 과장되지 않았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게 그어 둔 선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워냈다. 정치가 이념의 고함보다 태도의 결로 기억되는 일이라면, 그는 그 출발선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다음 장면은 더 또렷하다.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또렷이 호명했다. 볼륨을 높이지도, 억지를 부리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체온이 반 박자 올라가며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는 전율이 있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진심은 꼭 눈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고, 설득은 목청의 높낮이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떨림 없는 목소리의 밀도가 사람을 움직이는 순간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말보다 속도로, 구호보다 절차로, 존재의 부피보다 일의 정확도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 내란 종식의 실현을 향해 내란 특별법과 국민의힘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 했다. 요란하지 않되 집요하게 길을 내고, 필요할 때는 바람을 정면으로 가르되 대부분의 시간에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데 힘을 보탠다. 정치는 성대가 아니라 근육의 기억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방식이다. 물론 말수가 줄었다고 정치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랬다면 묵언수행이 국정의 기술이 되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당 대표를 뽑는 지금, 많은 이들이 말한다. “정청래도 좋고, 박찬대도 좋다.” 맞는 말이다. 한 사람은 불꽃의 에너지를 지녔고, 다른 한 사람은 불씨를 오래 지키는 법을 안다. 문제는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이다. 선택은 인기투표가 아니라 공동 운영의 파트너를 정하는 일이어야 한다. 국정은 릴레이와 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육대회 2인 3각에 가깝다. 배턴만 잘 넘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발목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첫걸음부터 꼬인다. 한쪽이 반 박자 앞서면 넘어지고, 각자 속도로만 뛰면 제자리에서 맴돈다. 지금 필요한 건 힘의 크기보다 호흡의 질, 방향의 옳음보다 조율의 정밀함이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내 시선은 박찬대에 머문다. 그는 겸손하되 자신감이 빠지지 않고, 유연하되 원칙이 흐려지지 않는다. 메시지는 절제돼 있으되 핵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말을 쌓기보다 간격을 재는 데 능하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동행은 구호가 아니라 일관된 실천의 기록으로 남아 있고, 플래시가 꺼진 뒤에도 남는 일을 택하는 태도는 정치의 품격을 구성한다. 세련됨이란 결국 쓸 말을 줄이고 할 일을 더하는 습관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그는 꽤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그러나 내가 그를 가장 신뢰하는 이유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조금 더 낭만적이다. 그의 얼굴에는 ‘아이의 미소’가 있다. 꾸밈없이 맑고, 어딘가 단단한 결기로 번뜩이는 그 표정은 연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속이 채워져야 얼굴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거짓말을 멈춰야 입꼬리가 자연스러워진다. 오래전 김대중 선생님의 얼굴에서 보았던 바로 그 종류의 미소—폭풍의 중심에서 오히려 고요해지는 표정—을 나는 박찬대에게서 본다. 독재에 맞서 긴 세월 옥고와 망명을 견디고도 끝내 화해와 포용의 정치로 한반도의 방향을 바꾼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가 ‘행동하는 양심’의 서사였다면, 박찬대는 갈등을 부풀리기보다 절차와 설득으로 해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그 정신을 오늘의 국회에서 이어가고 있다. 정치는 결국 얼굴의 업이고, 얼굴은 하루 이틀의 분장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완성된다면, 이 미소는 가볍지 않다.
정청래 후보의 장점도 분명하다. 대중적 인지도, 강한 추진력, 응집된 지지의 에너지. 그 모든 것은 당의 자산이고 여당의 무기다. 다만 지금의 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마지막 한 조각—대통령과의 호흡, 국정의 리듬, 갈등을 불꽃으로 키우지 않고 열로 전환하는 능력—을 생각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박찬대라는 이름에 더 오래 시선을 둔다. 무대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능력만큼, 무대가 기울지 않게 받치는 균형추의 힘이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무대를 빛나게 하는 이는 종종 조명감독이다.
정치는 달리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버티기의 연속이고, 버티기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는 일상의 힘으로 가능해진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누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누가 흔들림 없이 조율할 수 있는가, 누가 소리를 줄이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가. 내 답은 이미 나왔다. 아이의 미소로 정치를 하는 사람, 말의 성찬보다 절차의 품격을 아는 사람, 요란한 박수보다 길게 남는 신뢰를 택하는 사람이다.
이 글의 제목을 ‘박찬대 유감’이라 붙였지만 그 ‘유감’은 이런 정치인을 우리가 더 일찍 앞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
| ▲ |
2001년 평양에서 길을 연 뒤, 80여 개국을 오가며 사람을 만난 여행가.
북녘에도 서른 번이 넘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로 다른 하늘을 올려다봐도 결국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한 가족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걷고 생각한다. 목적지는 하나, 더 평화로운 지구별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CWN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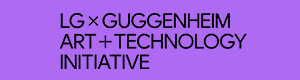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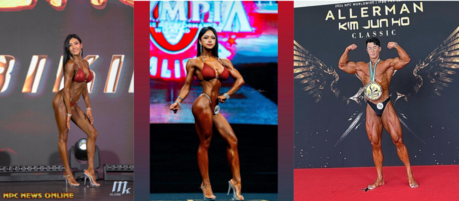





![[구혜영 칼럼] 사회복지교육은 미래복지의 나침반이 되어야](/news/data/2026/01/16/p1065596364370517_157_h.png)





